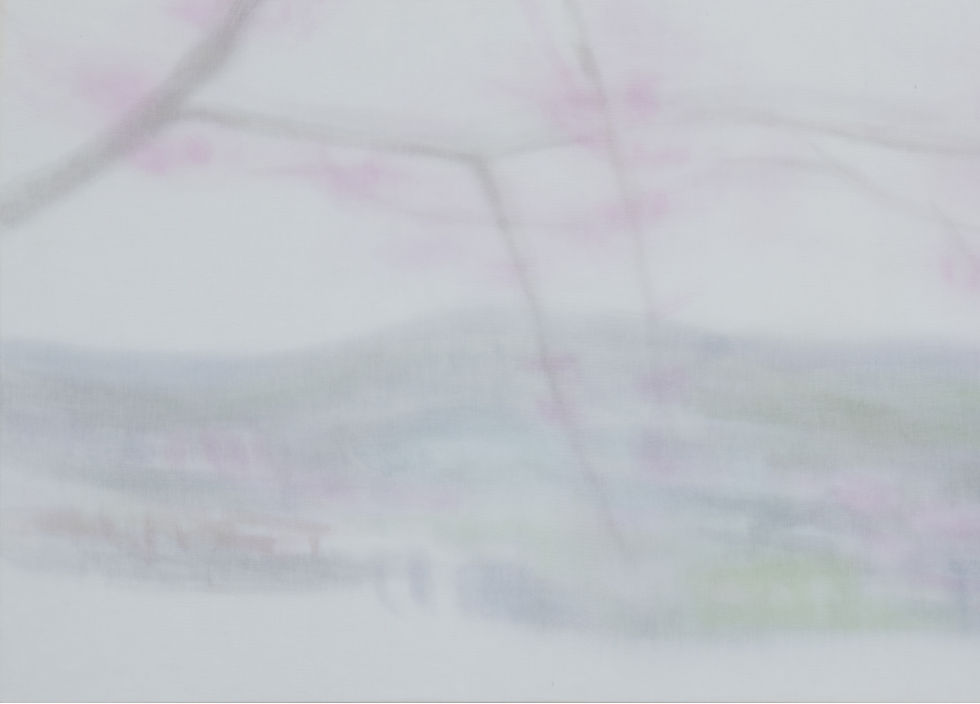遊牧詩人 유목시인
A Nomadic Poet
遊牧詩人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의식도 없는 것처럼 누워 계시던 아버지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종이와 펜을 달라고 했을 때 나는 이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지 않았다면 눈도 잘 보이지 않았을 아버지께 손바닥보다 작은 수첩 종이를 뜯어드릴 그런 주책 맞은 딸은 없었을 테니까.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급하게 그러나 또렷하고도 힘있게 획을 그어 나가셨는데, 나는 ~로 간다 라는 일본말과 최근에 떠난 사촌 동생과
군대 시절 전사한 부하의 이름, 그리고 遊牧詩人이라고 쓰시고는 펜을 놓으셨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아버지의 유언이자 유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는 다시 누우셔서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버지는 가셨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루며 우리 형제들은 아버지가 쓰신 작은 메모지를 보며 마지막 글 인지도 모르고 건성으로 보고있던 무심함에 눈물 흘렸다. 그리고 그 네 글자,
遊牧詩人의 뜻에 대해 분분했다. 항상 책 읽기를 좋아하시던 아버지라 혹 소설 제목은 아닐까 아버지가 다니시던 도서관의 대출 목록도 훑어보고 이런 저런 이유도
유추해 보았으나 우리는 그저 인생이란 유목민처럼 정처없이 떠나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정도만 생각할 뿐 이었다. 그러고는 우리들은 마지막 가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그 단어가 주는 가벼운 압박감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었다. 그렇게 잊혀가는 가 보았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을 보면 못 먹을 것처럼 목이 메다 가도 조금 안 가서 잊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유목시인 이라는 글자도 잊혀지고 아무도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이 되었고 나는 창가에 서서 11월 늦가을의 거리를 보고 있었다. 거리에는 엊그제 내린 비에 색깔이 거뭇하게 변해버린 낙엽들이 추적추적 쌓여 있었다. 가을의 말미를 아름답게 장식하던 낙엽들도 이젠 퇴장할 때가 된 모양이었다.
청소부 아저씨들은 트럭을 대놓고 나뭇잎을 쓸어 담고 있었다. 예전에는 나뭇잎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쓸어 가더니, 심지어는 나무를 흔들어 잎을 떨어뜨리던 청소부 아저씨 들도 있었는데 요즈음은 나뭇잎이 거의 다 떨어질 때까지 치우지 않고 수북이 쌓아 놓는 게 거리를 다닐 때 마다 여간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다.
잔뜩 쌓여진 나뭇잎 더미를 싣고 떠나는 트럭들은 마치 짐을 싣고 떠나는 이사 행렬 마냥 보였다. 나뭇잎은 이 길을 떠나서 어디론 가에 모여 불꽃과 함께 사라지면 될 테지만 나는 이 한 해를 어떻게 떠나 보내야 할지 막막하였다. 이제 한달 만 지나면 올해도 끝이었다.
여름내 무성한 잎 들에게 열심히 물을 나르고 햇볕을 퍼트리던 나무들은 이제 일들을 다 떨구고 홀가분하게 쉬고 있었다.
그 겨울 나무를 보면서 아버지 생각이 났다. 사는 것은 순리를 따르는 것이라 하셨던 아버지는 매년 영정에 쓸 사진을 찍으면서, 당신의 장례식에 입으실 턱시도를 손질하면서, 그리고 당신이 묻히실 그 땅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면서 무척이나 편안해 하셨었다.
아버지는 저 나무 같았을까.
일년 내내,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무성한 초록의 잎들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난 후 이제는 홀가분하게 서 있는 저 겨울나무처럼 아마도 양들을 배불리 먹이고 또 다른 풀밭을 찾아 떠나는 유목민같이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떠나셨을까, 어디에 풀밭이 있을까 전전 긍긍 하지 않고 시인의 마음으로 떠나는 유목의 길.
새로운 풀밭을 찾아 떠나는 유목민처럼 나는 언제나 떠나고 싶어 하였으나 서투른 유목민인 나는 무엇을 싸야 될지 무엇을 버려야 될지 그
리고 어디로 떠나야 할지 막막 하였다.
시 한 줄 쓰시지 않은 아버지가 내게 던져주신 詩人, 그리고 遊牧이라는 글자,
계절 탓이겠지 하면서도 그 말은 마치 스님들이 툭 하고 내 던지는 화두처럼 내게 자리잡았다.
유목시인 IV 얇은 천에 염료 71×34cm 2001